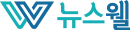“어린 시절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습니다. 싸움의 여파가 늘 제게 몰려왔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말끝마다 저를 원망하곤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의 너를 낳는 바람에 인생이 꼬였다”는 말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 존재를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춘기 무렵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아버지는 저를 양육하기보다 방치하고 외면했습니다. 며칠, 몇십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무려 42일 동안 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에게 찾아갔지만 역시 저희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20대 노숙자, 그게 10년여 전 저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최준영 교수님이 특강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대체 누구길래 사람 마음을 이렇게 깊이 후벼파는 걸까? 뭐라 정의하긴 힘들었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라는 것, 오랜 실천 속에서 길어 올린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 문득, 닮고 싶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다시 공부해서 저분처럼 되고 싶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거리의 삶을 잘 아는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어 거리의 아저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졌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사이버대학 입학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노력 끝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이듬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올초 3년 반 만에 조기졸업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은 일생 딱 세 번 와봤습니다. 무엇보다 최준영 교수님을 뵙는 게 설렜습니다. 혹여 이런 자리에 와서 누가 되진 않을지 걱정하며 드레스코드는 어찌 되는지 여쭙기도 했습니다(장내 웃음). 오늘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저도 최준영 교수님처럼 별명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처럼 사회에서 붙여준 별명 하나 갖는 게 저의 다음 꿈입니다.”

지난 14일 <가난할 권리> 북토크(사진)를 했다. 30여 명이 함께했는데 반 이상이 지역자활센터의 저소득 이웃과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었다. 특히 대전에서 올라온 경석이(가명)는 추천사를 써준 김범준 교수와 함께 무대에 올라 지난했던 삶의 여정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가난할 권리> 중 ‘사람답게 한번 살아 보려고요’(111~121쪽)에 등장하는 경석이는 실존 인물이다.
20년 동안 거리의 노숙인, 지역의 저소득 한 부모 여성 가장, 미혼모, 교도소 재소자, 탈학교 청소년, 독거 어르신 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해왔다. 가난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기대기나 좋아하고, 도움이나 바라면서 놀고먹는다는 편견에 시달린다. 하지만 내가 만난 분들은 그와 다르다.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가난하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20년 동안 그들 곁에서 함께 지내며 내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론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게으르거나 못난 사람이 아니다. 가난하지만 나름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다. 그 사실에 주목한 것이 이번 책이다. 풀어쓰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난할 권리’다.
축하해주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준 분들이 많다. 저마다 덕담을 해주셨는데 그중 원호남 선생님의 말씀이 퍽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나온 최준영 선생의 책을 거의 다 읽었다. <결핍의 힘>, <동사의 삶>, <결핍을 즐겨라> 등, 그중 인상적이었던 건 < 제 쓴 글이 부끄러워 오늘도 쓴다>였다. 최준영의 책은 쉽게 잘 읽힌다. 이전에 읽은 책들이 죄다 그랬다.
이번 책은 다르다. 쉽게 읽힌다는 점은 같지만 그걸 읽고 난 뒤의 기분은 사뭇 다르다. 뭐라 할 말을 잃었다. 뭐라 해야 할지 몰라 며칠을 망설였고 글을 쓸 수조차 없었다. 최준영 선생에게 붙은 형용사가 많다. 거지교수, 노숙인 교수, 거리의 인문학자, 최좌절, 최결핍. 이 책을 읽은 뒤 최준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최준영은 그냥 최준영이다. 별다른 수식어나 형용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책 제목에 ‘가난’이라는 글자를 넣은 건 거의 책을 팔 생각이 없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지적은 뼈아팠다. 중요한 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가 아니다. 다만 이 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사회적 공감이 싹 트기를 바랄 뿐이다. 그게 바로 책을 낸 목적이며, 2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이어온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