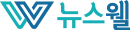수타니파타(최초의 불교 경전)에는 유명한 문구 ‘소리에 놀라지 않은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나온다. 또한 비슷한 문구가 법구경에도 있다. ‘정복한 나라를 버린 왕처럼 숲속을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어렸을 때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매혹당해 한 시절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보냈지만, 오토바이 공회전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게 되자 법구경의 코끼리처럼 살고 싶었다.
제국주의 국가나 패권국가는 사자 문양을 선호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인도는 코끼리를 왕의 상징처럼 여긴다. 러시아가 사자의 기세를 상실한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할 국가는 인도가 될 것이다. 코끼리와 같이 비동맹국가군의 이니셔티브를 놓친 적이 없다.
팬데믹 이전 2019년 즈음에도 다음과 같은 중국 금융시장의 대붕괴를 상정하는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었다.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 중국의 자본유출 →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채권 회수 → 일대일로 국가의 디폴트 선언 →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속.
킬 체인의 격발은 미-중 간 금리 차이의 역전 혹은 접근을 기초로 하는 것이었는데, 팬데믹 기간에는 4% 가까이 벌어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다. 판이 차려진 것이고 미국 재무부는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할 것이다.
험난한 시기에, 서유럽이나 극동의 선진국 가운데 미들급 국가(독일·프랑스·영국·한국·일본)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후카가와 유키코의 조언을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인도 같은 비동맹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인 세계사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UNCTAD(국제무역개발협의회)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편입시킨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80년대 초반에는 다른 의미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교류가 많았는데 그 와중에 벌어진 아웅산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헌트>는 하드보일드(1920∼1930년대 미국 문학에 등장한 새로운 사실주의 수법으로, 군더더기 없이 냉정하고 비정하게 인물과 사건을 묘사한 소설이나 영화)하다.
군사정권의 야만성은 한국전쟁과 월남전, 이에 더하여 미-소 간 냉전을 겪으며 가득찬 것일 수도 있지만, 자연 상태와 인간 이성의 절충 혹은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군사교범과 헌법이 어느 시점에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이기도 하다.
법으로 상징되는 객관적 이성이 호르크하이머의 말대로 나치 같은 특정 집단만의 주관적 이성에 의하여 형해화되면, 전체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순식간에 ‘법을 지배하는 것’으로 전도시켜 버린다. 몽상이 법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군사정권이 출현했던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결국은 민주주의를 한 발자국 더 실질적으로 진전시켰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는지는 오직 진실과 대면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만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 타자의 얼굴을 직면하는 것은 ‘역사의 천사’가 역사의 잔해가 쌓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동일하다.
더불어 자본주의 역사 속에 널브러져 있는 시장실패의 잔해 속에서 1996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무역적자 + 기축통화국과의 금리 역전이나 장단기 금리의 역전 + 원/달러 환율의 1400원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트>의 배경이 된 80년대 초반에는 3저 호황이, 1996년 외환 위기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던 세계화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고도성장의 날개를 달고 이륙하던 중국 산업의 현대화가 손을 내밀었지만 2023년 경제위기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헌트>에서 보여준 이정재의 연출력은 예상 밖이다. 마치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같다. 박평호와 김정도의 신념은 주객전도의 모순 속에서도 팽팽하게 균형을 이룬다. 시대가 심리 안에 갇혔지만,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은 공감하고 전율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