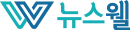세도정치 수탈기, 일제 강점기,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한국전쟁, 4·19혁명, 5·16군사쿠테타, 베트남전쟁, 5·18민주화운동. 산업화와 민주화를 헤쳐나온 우리에게 대하드라마는 역사라는 수레바퀴를 직접 짊어진 개인들의 신산한 삶을 마주 보고 복기하게 만든다.
그 후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한 사이클을 겪는 동안, 개인들은 자본의 한계효용을 실시간으로 실현하는 자본시장의 세계화 및 국제적 분업을 달성하는 ‘지구적 공급망’(Gloval Value Chain)에 적응하면서 스스로를 ‘노마드’(Nomad,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혹은 ‘코즈모폴리턴’(cosmopolitan, 세계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허세 부리고 있었지만 이내 한계를 드러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민주당은 키신저의 후예로서 대서양의 나토와 태평양의 한·일·호주 등 해양 세력을 지렛대 삼아 유라시아대륙을 견인하는 오래된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공화당 혹은 트럼프의 중국을 타깃으로 삼는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20세기 전반 세계의 ‘디아스포라’(Diaspora, 과거 유대인처럼 본토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를 끌어들이는 신세계였던 미국은 더 이상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노예무역과 사탕수수무역, 산업혁명 이후 공동화되었던 유라시아대륙의 한가운데가 신세계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지구적 판짜기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전쟁이 시작됐지만, 러시아나 중국은 여전히 20세기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서유럽의 산업혁명과 미국의 대량생산이 자본주의를 심화하는 과정에서 부르주아지(Bourgeoisie, 부를 쌓은 자본가 계급)가 획득한 대의민주주의와 공화제에 도달하지 못한, 유라시아대륙의 거대 국가들은 21세기에도 전체주의의 광기와 공허한 분열주의 모순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역설적으로 소련의 몰락으로 냉전이 정리되면서 러시아가 유럽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처럼 보이고 중국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원격통신이 본격화할 때, 노마드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실크로드로 부활한 것처럼 보였지만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위기에 봉착했다.
낭만적인 노마드는 과학기술 혁명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국제전의 최소화와 무역장벽의 완화가 본질적인 조건이었음이 드러났고 두어 달 만에 그대로 붕괴하고 말았다.
참혹한 디아스포라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이나 봉쇄된 상하이 시민들 이전에도, 중남미의 캐러밴이나 북아프리카·중동 지역의 난민들처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일종의 원죄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약 카르텔, 근본주의 테러리스트가 될 수 없는 침묵하는 양떼로서 안전한 방주를 찾아 정처 없이 세계를 떠도는 것이다.
<파친코>의 선자나 한수가 디아스포라로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처지와, 솔로몬이 노마드로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횡단하는 입장은 상반된 것임에도 솔로몬은 일본에 남아 착종하기로 결심한다. 결국 귀화해서 침묵하는 양떼가 되거나, 조총련이나 파친코 업자가 되어 주류사회에 맞서 끝없이 맞불을 놓고 투쟁하는 것만이 남는다.
그는 더 이상 학벌이나 교양 같은 구별 짓기가 본질인 문화자본을 체화하고 은행계라는 자본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대신, 경제 자본 그 자체인 파친코 업자가 되어 계급투쟁의 프레임 따위로는 잡히지 않는 투쟁을 벌이려는 것이다. 삼켜지지도 않고 뱉어지지도 않게 말이다.
예전에 TV에서 박경리의 <토지>를 드라마로 방영할 때마다 책 읽기에 도전하곤 했는데, 결국은 <김약국의 딸들>을 읽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서희와 길상이 선자와 한수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풍광의 재현보다는 서희나 길상의 이야기가 익숙하기 때문이다.
서희는 10여 년 만에 만주에서 평사리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선자가 영도에 돌아오는 데는 반세기가 결렸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편협한 한반도 경략에서 벗어나 그들이 노마드이든 디아스포라이든 품어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