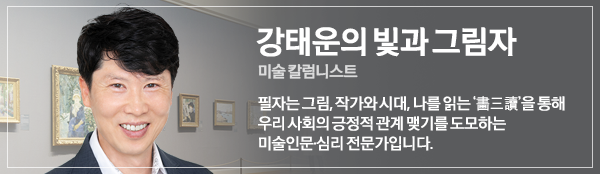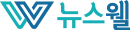군중 속에 관능적인 누드모델은 뜬금없다. 정작 캔버스에 채워진 건 누드가 아닌 풍경이다. 화실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다가도 보면 볼수록 엉뚱하다. 주위 사람들은 이런 엉뚱함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자기 앞의 생에 진지하다. 낯섦과 친숙함이 공존하는 풍경은 다수의 침묵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더한다.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어떤 설명을 통해 이해되는 일로 정리되지 않으면 몇 날 며칠 이 장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꿈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다. 그림은 막 꿈에서 깨어 다시 꿈을 떠올리는 순간 어디쯤 관객을 세운다.
시선은 다시 화실 중앙으로 쏠린다. 아이는 그림 그리기에 몰두한 화가를 경이롭다는 듯 쳐다본다. 통통한 볼살만큼이나 궁금증이 많은 아이다. 아이가 화가에게 묻는다.
“화가가 된 거야?”
“그래. 여긴 내 화실이야.”
“완전 부럽다. 수염도 멋져!”
“수염만? 파리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풍경은 내가 자주 놀러 가던 계곡이잖아. 프랑슈콩테.”
“내 고향이기도 해. 시골 마을. 언제나 가고 싶어.”
“옆에 누나는 누구야?”
“아름답지? 모델이야. 누드모델.”
“멋지긴 해. 그런데 우리 엄마처럼 포근해 보여.”
“너, 엄마 보고 싶구나. 나는 비너스나 천사는 안 그려. 본 적이 없거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친구야?”
“오른쪽에는 친구랑 후원자. 저 끝에 책 읽는 친구 보이지? 보들레르야. 고마운 친구지. 책벌레고. 왼쪽에는 내가 지키려는 사람들과 내가 싸우려는 사람들.”
“싸우지 마!”
“때론 싸워야 해. 없는 사람들 못살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야. 보이지 않는 것에 영혼을 팔면 안 돼.”
<화가의 화실>로 알려진 그림은 사실주의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 1819~1877)의 회심작이다. 쿠르베는 이 그림에 <나의 예술적, 도덕적 7년 세월을 요약하는 사실의 알레고리>라는 부제를 달았다. 화가의 삶이 압축된 그림은 감각적인 누드와 시골을 떠오르게 하는 풍경,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얽히고설킨 사람들이라는 흥미로운 알레고리를 담고 있다. 평소 보던 그림과 결이 달라 기존 독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쿠르베는 다양한 공간과 관계망에 존재하는 인물들을 불러와 한곳에 붙인 콜라주 형식의 그림을 시도했다. 시공간을 초월한 관계의 존재 방식에 대한 화가의 통찰력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따지고 보면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로 대표되는 입체파는 다양한 각도로 본 인물 하나하나를 잘라 붙여 시선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여주었다. 누구나 거인의 어깨를 딛고 오르는 법이다.

쿠르베는 그림 한 가운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기애’(自己愛)의 화신, 나르키소스에게 뒤지지 않았다. 쿠르베의 실제 삶이 그랬다. 출중한 외모와 당찬 포부, 여기에 탁월한 그림 실력을 갖춘 쿠르베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쿠르베는 작품을 통해 대담한 사회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혁신가이자 오피니언 리더였다. 쿠르베는 자신의 대의와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자기 삶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그림 주위에 세웠다. 그들을 한명 한명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아도취 기질이 있었던 쿠르베는 결혼과 맞지 않았고, 결혼은 곧 구속이라고 생각했다. 독신으로 살았기에 그림에 가족은 등장하지 않는다.
쿠르베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노동을 묘사한 그림으로 근대 회화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주류에서 중시하는 이상화되고 인습적인 그림을 거부하고 세상을 본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내게 천사를 보여다오. 그러면 천사를 그리겠다”라는 쿠르베의 말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화된 세계에만 관심을 두던 당시 세태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충실히 재현하겠다는 쿠르베의 의지가 담겨 있다. 덕분에 쿠르베는 주류 미술계에서 관심 두지 않았던 비참한 농촌 환경과 열악한 노동자의 일상을 현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래서일까. <화가의 화실>은 1855년 국제박람회에서 거부당했다. 표면적으론 그림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캔버스 크기는 361 X 598cm이고, 인물과 대상은 실물 크기로 그려졌다. 주최 측의 숨은 속내를 읽어보면 쿠르베가 시도한 알레고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컸다. 사회의 불편한 이면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그림은 추악하고 불경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주의 화풍은 쿠르베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자세히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관심이 간다. 쿠르베는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약자들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다. 자리가 없다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의미한다. 쿠르베는 자기가 그린 그림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 한 번도 정치색이 풍기는 그림을 그리지 않은 쿠르베를 정치 성격이 농후한 화가로 평가하는 이유다. 쿠르베는 <화가의 화실>에 초대할 손님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초대 목록을 지지자와 후원자, 그리고 명망가로 한정하지 않았다. 캔버스 왼쪽 바로 옆자리에 찢어질 듯 가난을 형상화한 여인을 앉혔다. 노동자, 농민, 사냥꾼, 이방인 등 당시 사회 밑바닥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초대했다. 심지어 약자들을 착취했던 사제, 무덤 파는 사람, 상인, 창녀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무엇보다도 누더기 옷을 입은 아이를 놓치지 않았다. 부부가 증오의 말로 서로를 지우려고 싸울 때 정작 지워지는 것은 싸움과 무관한 아이들이었다.
존재에는 높고 낮음이라는 계층적 사다리가 없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계층적 사고가 아니라 관계망 식 사고가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이 지은 작은 관계망이, 주고받는 나눔이 그리 대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관계망이 받쳐 주는 사람들에겐 모든 것일 수 있다. 관계를 맺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가 된다. 부적합자라는 단어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나’는 누구나 중요한 존재다. 계층적인 시선으로 보면 알 수 없지만, 관계망이 수놓은 수많은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피를 돌게 하는 존재다.
쿠르베는 사적인 관계망 역시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싸우고자 했던 이들은 비록 ‘적’이자 ‘악’이었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쿠르베는 누구 하나 지우지 않았다. 요즘 미디어에는 상대 진영을 지우려는 위정자들로 가득하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주위를 채우면 같은 경험이 반복되고 생각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성을 바라보는 이해 지수는 떨어지고 관계는 점점 황폐해진다. 서로를 지우려는 위정자들의 싸움에 정작 지워지는 건 싸움판에 있지도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이다.
사회적 약자를 지우는 방식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적으로 진화 중이다. ‘복지’라는 이름의 가상 시스템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죄다 ‘복지’에게 맡긴 채 외면한다.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담기지 않는 복지는 오히려 사람을 지우는 창백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지우는 상실의 시대를 산다. 지우는 행위는 피아(彼我)를 가리지 않는다. 결국은 자신을 지우는 일로 귀결된다. 쿠르베는 누구 하나 지워지지 않은 사회를 꿈꿨다. <화가의 화실>은 엉뚱하지만, 아름다운 그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