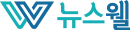고등학교 수학에서 극한과 미적분을 처음 배울 때, 무한이라는 개념에 깊이 빠져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정도면 무한이 아닐까 생각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면 무한은 또 저만치 뒤로 물러나 우리를 손짓해 부른다. 아무리 다가서도 계속 뒤로 물러나 닿을 수 없는 산 너머 무지개처럼, 무한은 다가설 수는 있지만, 도착해 깃발을 꽂을 수는 없는 장소다. 무한히 작아 0을 향해 무한히 가깝게 다가서는 과정은 무한히 커지는 과정과 그리 다르지 않다. y = 1/x로 적고 x를 100, 1000, 10000으로 무한을 향해 계속 늘리면 y는 0.01, 0.001, 0.0001로 점점 무한히 가깝게 0을 향해 다가선다. 이처럼 무한히 작은 것과 무한히 큰 것은 단짝 친구다. 영(0)과 무한(∞)은 오랜 동안 우리 인간 정신을 끊임없이 매혹시켜왔다. 무한이 특별하듯 0도 특별하다.
1과 2가 같다(1=2)는 것을 보일 테니 아래의 증명과정을 눈 부릅떠 지켜보시길. 자, 먼저 a=b=1이라고 놓자. 양변에 a를 곱하면 a² = b·a이고, 양변에서 b²을 빼면 a²–b²=b·a– b²이 된다. 다음에는 양변을 각각 인수분해해서 (a+b)·(a-b) = b·(a-b)를 얻게 된다. 양변에 (a-b)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 이를 싹 지워 정리하면 a+b=b가 된다. 처음에 a=b=1이라고 했으니 a+b=2이므로 2=1이다. 1과 2는 정확히 같다.
하나와 둘이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서, 1=2를 보인 위의 증명과정이 맞을 리 없다. 도대체 이 재밌는 증명과정에서 은근슬쩍 넘어간 틀린 부분이 어디인지 눈치 채셨는지? 위의 계산에서 (a-b)를 양변에서 지운 것이 잘못이다. a=b로 시작했으니 a-b=0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양변을 0으로 나눈 셈이다. 0은 0이 아닌 숫자와 정말 달라서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수학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계산하다 0으로 나누면 대한수학회에 벌금을 낸다는 얘기가 아니다.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은 인간이 아닌 수학의 금지사항이다. 위의 엉뚱한 증명처럼,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것을 수학이 허락하는 순간 1과 2가 같아진다. 1과 2뿐 아니다. 어떤 숫자도 다른 모든 숫자와 같아진다. 바로 이 주제를 다룬 테드 창의 단편소설 <영으로 나누면>을 추천한다. 0은 이처럼 수학에서 특별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0의 존재는 철학적으로도 무척이나 흥미롭다. 0을 ‘아무것도 없음’으로 생각하면, 0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영어로 이를 바꿔 적으면 ‘nothing exists’다. ‘아무것도 없음’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와 정확히 같은 문장으로 적혀서, 0의 존재가 일종의 형용모순처럼 들리게 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진공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물론 우리는 0과 진공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알고 있지만, 인류가 둘을 발견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0도 재밌지만 무한은 더 재밌다. 짧고 긴 선분을 종이위에 위 아래로 평행하게 나란히 그려보라. 그림의 파란색, 빨간색 선분처럼 말이다. 긴 선분위에는 무한개의 점이 있고, 짧은 선분위에도 당연히 무한개의 점이 있다. 긴 선분은 짧은 선분에 다른 짧은 길이의 선분을 이어 붙여 만들 수 있으니,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긴 선분 위에 훨씬 더 많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그럴까?
두 선분의 왼쪽 끝을 서로 연결하는 선과 오른쪽 끝을 서로 연결하는 직선을 긋고 두 선이 만나는 점을 생각하자. 그림의 P가 바로 그 점이다. 점 P에서 시작해 두 선분을 관통하는 직선을 긋고 바라보면, 짧은 선분 위의 점 A에는 긴 선분위의 한 점 B가 정확히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긴 선분위에서 점 하나를 고르면 그 점에 대응하는 딱 하나의 유일한 점을 짧은 선분위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임의로 고른 짧은 선분 위의 점 하나는 긴 선분 위 딱 하나의 점에 일대일로 대응하게 된다.
설거지 할 때 쓰는 고무장갑 생산 공장을 떠올려보자. 공장안의 한 상자에는 왼손 장갑만 가득, 다른 상자에는 오른손 장갑만 가득 담겨있다. 각 상자에서 장갑을 하나씩 꺼내 왼손/오른손 짝을 맞춰 함께 포장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만약, 왼손 장갑이 담긴 상자가 텅 비었는데, 오른손 장갑이 담긴 상자에는 장갑이 하나 남았다면, 오른손 장갑이 더 많은 것이고, 거꾸로 왼손 장갑 상자에는 여전히 장갑이 남아있는데 오른손 장갑 상자가 먼저 비워졌다면, 왼손 장갑이 많다는 얘기다. 하나씩 꺼내 모두 짝을 맞췄는데 두 상자가 동시에 비워졌다면 왼손 장갑과 오른손 장갑의 숫자가 정확히 같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다. 두 집합의 원소 사이에 정확히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어서 둘 중 어느 집합에도 하나씩 짝을 지은 다음에 남는 원소가 없다면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정확히 같다. 위에서 우리는 짧고 긴 두 선분의 점들에 대한 일대일 대응을 찾았으므로 결국 두 선분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는 정확히 같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긴 선분에 있는 점의 수도 무한이고, 짧은 선분에 있는 점의 수도 무한인데, 그 두 무한은 정확히 같다는 놀라운 얘기다. 짧은 선분 두 개를 이어 붙여 긴 선분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무한에 무한을 더해도 정확히 같은 무한이 되는 셈이다. 1에 1을 더하면 1이 아니지만, 무한에 무한을 더하면 정확히 같은 무한(∞+∞=∞)이다.
무한과 극한을 수학에서 배운 사춘기 때 종교와 신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수업에서 배운 무한이 신을 닮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무한에 무한을 더해도 같은 무한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자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저 멀리 떡 버티고 있는 무한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서는 과정으로서의 무한을 떠올린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로서의 신을 말할 때, 나는 무한과 이상에 닿으려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인간의 여정을 생각한다. 유한한데 무한을 생각할 수 있고, 짧은 순간 존재하지만 영원을 떠올릴 수 있는, 애틋해서 더욱 기특한 인간을 떠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