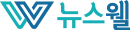지난 4월 초에 강원도 화천으로 예비군훈련을 간 적이 있다. A형 텐트 옆 계곡엔 팔꿈치 두께의 얼음이 아직 녹지 않았고 뜻밖의 추위에 모두 앓는 소리를 내야 했다. 군악대 연주와 함께 예비군훈련을 마치자마자 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W를 만나기 위해 춘천으로 갔다.
비디오방에서 헤드폰을 끼고 캠피온의 <피아노>를 봤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캠피온은 여전히 가부장제를 둘러싼 여러 금기에 대한 도전(존속살인, 근친상간, 동성애 등등)을 미끼 삼아 우리를 끌어들이고 결국엔 비수를 꽂는다. 상처 혹은 균열은 다름 아닌 균형점이 되고 만다. 아프지 않고 휘산감마저 든다.
1920년대 후반엔 대공황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달러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이나 영국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대규모 채권을 조성했다. 대공황은 직관적인 분석이 쉽게 허용되지 않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①달러부채는 기업과 가계의 소비활동을 증진하지만 자산버블을 가져오고 어느 시점에서든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다. ②공급 과잉된 산업부터 도산이 시작되고 금융시스템은 붕괴하지만, 누군가는 헐값으로 기업과 자산을 사들일 기회를 얻는다. ③개별국가는 뉴딜 등의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끌어올리고 자산가격은 회복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거대한 재정거래(arbitrage) 이익을 실현한다.
가깝게는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금융위기, 2010년대 초반 유럽의 ‘PIGS 사태’ 모두 이러한 전철을 밟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미친 영향은 사실상 3차 세계대전 급이다. 교역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2차 대전 이후 가동된 마샬 플랜의 8배가 넘는 공적자금이 살포되었다.
파괴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미 각국의 자산가격은 폭등 중이다. 원자재, 임금, 물류비용 등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명목이자율을 높이고 통화당국들은 앞다퉈 금리 인상 경쟁을 벌여야 한다.
세계는 대공황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이다. 방아쇠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에서 당겨질 것이고 여기에 아시아와 유럽의 지정학적·정치적 위험은 기름을 부을 것이다. 우리는 1996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확립해두었던 매뉴얼을 꺼내 들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메르스 사태의 매뉴얼을 펼쳐 보듯이.
<마더>와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를 섞어놓은 듯한 <파워 오브 도그>엔 20세기 초반의 위태롭던 여러 금기가 미국 서부의 경이로운 자연과 얽혀 위압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캠피온은 20세기 전반을 물들였던 전면전이 징집한 젊은 병사들과 상비군 제도를 몬태나의 목동들을 묘사하며 비아냥거린다.
아직도 직장의 동료 여직원에게 아들을 심약하게 키우면 엄마가 전쟁과 폭력, 궁핍과 신경증에 노출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캠피온은 비수같이 정확하게 엄마를 지키려는 허약해 보이는 아들의 결단과 지혜를 보여준다.
피터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친부와 동성애자임을 감추기 위해 과장된 남성성을 과시하던 계부의 형을, 그들의 개 같은 권세를 명쾌하게 응징한다. 필이 피터에게 허세를 부리며 보여주었던 해 질 녘 산 그림자에서 피터가 이미 울부짖는 들개의 모습을 찾아냈다고 말하는 순간, 자연에 대한 경외심 속에 드리운 폭력의 유전은 종언을 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