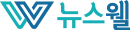마사회 “핵심부서에 수평 이동한 것, 전혀 문제될 것 없다”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우남 회장은 올해 3월 마사회장으로 취임 후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지낸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하며 채용을 강요하다 검찰에 고발됐다. 김 회장은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은 지난 24일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검찰에 넘겨진 이틀 후인 26일 김 회장은 인적 쇄신을 이유로 사건 피해자인 인사처장을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로 각각 전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를 두고 “보복성 인사” “2차 가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회장이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데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인사 전에 김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 2차 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김 회장은 인사를 무시하고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마사회 측은 “사실상 신분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적인 전보 인사”라고 반박했다.
마사회 측은 “4월 13일 김 회장의 폭언 등이 한 방송에 보도된 이후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회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면서 “부회장-인사처장-인사부장으로 이어지는 인사라인은 회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교감이 이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회장에게 보고된 적 없는 2차 가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7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중단됐던 경마장 입장의 재개에 대비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우남 회장은 취임 때부터 인사쇄신을 통한 조직혁신 의지를 천명했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 24일 비상 간부회의에서도 기관 경영평가 E등급에 따른 경영개선안 마련, 7월 이후 경마정상화 등 산적한 당면현안을 위해 임원진을 비롯한 간부직원의 인사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며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 변경한 것은 마사회 핵심 부서에 수평 이동한 것이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사회 측은 “마사회의 보직은 핵심보직과 한직이 따로 없으며, 업무역량과 전문성, 도덕성과 동료 간의 신임 등을 기준으로 인사권자인 회장이 적의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므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마사회는 또 “부회장 해임의 경우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했던 담당 본부장으로 ‘2020년도 기관 경영평가’에서 마사회가 최하위 점수인 E등급을 받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을 해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회장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회장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했던 담당 본부장으로 2020년도 기관 경영평가에서 마사회가 공기업 중 최하위이자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아 회장이 해임되는 상황에 직면케 했기에 당시 회장을 보좌했던 책임을 물어 보직을 해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회장은 지난 4월 9일 회장의 인사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바 있고, 출근 후에도 회장에게 지난 70여일 넘게 단 한차례의 대면보고, 유무선 소통 시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하였기에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문책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