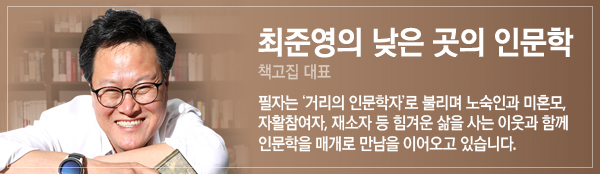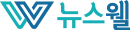내 가난한 청춘의 추억 속에 담긴 이야기다. 고교과정을 검정고시 야학에서 마친 나는 대학에 입학한 뒤 야학교사로 활동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다녔던 야학에선 활동할 수 없었다. 무허가 건물에 들어 있던 야학(상록수의 집)이 재개발 바람에 휩쓸려 하루아침에 쫓겨나 버렸기 때문이다. 도리없이 야학교사 활동은 다른 곳에서 해야 했다.
흩어졌던 ‘상록수의 집’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은 건 뒤늦게 결성한 동문회였다. 초창기 야학 동문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청량리 인근에서 만나 식사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일관했다. 1년여 가 지난 뒤 누군가 동문 모임을 좀 더 의미 있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다.
한 달에 한 번 양평 두물머리 근처에 있는 보육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매달 스무 명 남짓의 야학교사 출신과 학생 출신들이 양평 근처의 보육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기를 무려 10여 년이나 지속했다. 그때 만난 보육원의 꼬마 시인과 두물머리에 얽힌 아련한 추억을 잊을 수 없다.
언론에 비친 보육원의 주인공은 늘 방문객들이고, 아이들은 뒷전이다. 아이들이 방문객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일지 모른다.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꺼리고 경계하기까지 한다. 특히 열 살 이상의 아이일수록 더 그런 편이다. 선물꾸러미를 들고 오는 여느 방문객들과 달리 우리는 맨손으로 가서 함께 놀아주고, 청소며 빨래를 도맡아 했는데도 2년여 동안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일을 돕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아이들과 친해질 필요가 있었다. 꾀를 내야 했고, 논의 끝에 아이들의 문집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문집을 내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원고 모집부터가 난항이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아이들이 글을 쓸 리 없었다. 우선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게 급선무였다. 한동안 문집은 아예 나올 가망조차 없었다.
보육원에 개 한 마리가 생기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순전히 아이들의 힘으로 개 한 마리를 장만했다.
사연은 이렇다. 철없는 아이들이 이따금 보육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알면 혼쭐이 날 일이었지만 철없는 아이들은 마치 엄마나 아빠에게 칭얼대는 걸 흉내 내듯 “엉아, 10원만, 100원만”을 요구하곤 했다. 산 중턱에 있는 보육원에선 그렇게 생긴 돈을 쓸 방법이 없다. 근처에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거나 빨래를 할 때면 간혹 동전이 발견되곤 한다. 출처를 캐물어 혼을 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발견한 돈을 버릴 순 없는 노릇. 커다란 돼지저금통을 장만했다.
어느덧 돼지저금통의 배가 가득 찼고, 묵직해졌다. 그걸 털어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원장님이 아이들이 모은 돈이니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로 했고, 고심 끝에 개 한 마리를 사기로 했다. 어린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돈으로 산 개라며 끔찍하게 생각했다. 온종일 개와 함께 뛰어다니는 게 일이었다. 덕분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방문자가 있을 때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던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서 개와 함께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개를 앞세운 아이들은 연일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다.
바로 그 개 덕분에 첫 문집이 나오게 되었다. 첫 문집에 초등학생이 쓴 시 한 편이 실렸다. 제목은 ‘오만원’이었다. 그 시 덕분에 수도 없이 많던 개의 이름이 하나로 정리되었다.
나는 집에 가기가 싫다
엄마가 없어서다
집까지 태워다 주는 고아원 봉고차도 싫다
그 차만 보면 친구들이 나를 놀린다
이젠 집에 오는 게 즐거워졌다
오만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만원 주고 샀으니까 이름이 오만원이다
나는 오만원이 좋다
나를 마중 나오고 같이 산에도 다닌다
친구들도 나를 부러워한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다
겁이 나지도 않는다
나에겐 오만원이 있기 때문이다
오만원은 엄마나 마찬가지다.
꼬마 시인의 시, ‘오만원’ 전문.
아이들마다 다르게 불러 최소 십여 개의 이름을 가졌던 개의 이름이 이 시 덕분에 ‘오만원’으로 굳어졌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던 아이들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 ‘오만원’으로 개의 이름을 통일시킨 소년에게 우리는 ‘꼬마 시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복슬복슬한 털을 날리는 오만원과 함께 정신없이 뛰어놀던 꼬마 시인을 비롯해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느 날 오만원이 사라져버렸다. 그날 아이들은 늦은 밤까지 이 산 저 산 헤매면서 목이 터져라 오만원을 부르며 찾아다녔다. 오만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그즈음 동네에 개 도둑이 들끓었다고 했다. 오만원이 사라진 뒤 꼬마 시인은 말이 없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꼬마 시인도 사라졌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말을 만들었다. 분명히 오만원을 찾으러 갔을 거라고.
오만원과 꼬마 시인이 사라지기 전에 함께 두물머리로 소풍을 간 적이 있다. 한동안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응시하던 꼬마 시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형, 나도 크면 저 강물처럼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꼬마 시인에겐 엄마가 있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쓸쓸했을지 모른다. 두물머리 소풍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꼬마 시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엄마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물이 만나 합수하는 곳이라 해서 두물머리다. 두물머리처럼 꼬마 시인도 엄마와 함께 삶의 강을 유유히 흘러가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현실은 만남 대신 이별의 아픔만 더해 줄 뿐이었다.
이름을 지어줘서 그랬을까, 꼬마 시인과 오만원은 유난히 가까웠다. 개에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투사했던 꼬마 시인은 오만원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했을 것인가. 오만원의 실종과 부재가 꼬마 시인에게는 또 얼마나 큰 상처이고 좌절이었을까.
꼬마 시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엄마는 만났을까. 만남과 소통의 공간, 두물머리를 지날 때마다 보육원에서 사라져버린 꼬마 시인과 오만원을 떠올리게 된다. 두물머리가 개발꾼들의 탐욕에 능욕당하고, 농사짓던 농부들마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을 두방망이질 당하는 기분이 되는 이유다. 만남과 소통의 두물머리가 몰수와 저지의 상징이 되었다니. 마치 내 청춘의 추억마저 훼손당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