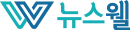“어릴 땐 엄마라고 불렀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니 내 키가 그분보다 커졌을 때부터였던 것 같다// 어쩌다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분이 가장 먼저 면회를 오셨다/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엄마'하고 불렀다// 내 키는 여전히 그분보다 크지만/ 마음의 키는 한참 작다는 걸/ 이곳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다.”(교도소 인문학에 참여한 어느 수형인의 시, <엄마와 어머니> 전문)
2008년 경희대학교 실천인문학센터 소속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안양교도소에서 2년여 동안 인문학 강좌를 진행했다. 위의 시는 당시 한 수형인이 강의 시간에 낭송한 자작시다. 시라고 부를 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낭송할 때 수강생 대부분이 눈시울을 붉혔고, 더러는 울음을 터뜨렸다.
강의 첫날 긴장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럴 만도 했다.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었고, 경험자의 조언도 듣지 못했다. 어떤 강의를 해야 할지, 목표 혹은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전에 자료를 살피고, 함께 논의해야 했지만 준비 기간이 촉박했던 탓에 곧바로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전례가 없는 건 아니었다. 2007년, 모 단체에서 교도소 인문학 강좌를 시작했고, 민간 교정위원들이 주축이 된 소년원과 교도소, 구치소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유된 정보는 없었다. 난감함을 달래는 한편,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컸다. 딴엔 아이디어를 낸 것이 수형인에게 시를 읽고 필사하고 낭송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강의 때마다 시 한 편씩 필사해 오게 했고, 낭송하게 했다. 처음 몇 주는 대부분이 과제를 제출했다. 한 달쯤 지난 뒤부터 과제를 내는 인원이 현저히 줄었다. 이유를 물으니 교도소에 필사할 시집이 더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 필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고민 끝에 필사 대신 직접 시를 지어보라는 제안했다. 과연 써올 사람이 있을지 반신반의하면서. 많으면 다섯, 적을 땐 두 명 정도가 시를 써왔다.
안양교도소 이후로도 교도소 인문학 강좌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대형 강당에 수백 명의 수형인을 모아놓고 강연하기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규모의 수형인들과 만나기도 했다. 의왕구치소에서는 일군의 판사와 법무부 직원이 보는 가운데 시범 강의를 하기도 했다. 여전히 긴장되는 일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임했던 기억이다.
수년 동안 교도소에서 강의했지만, 그게 과연 수형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인문학 수강 이후의 변화나 재범률 추이 등의 자료를 보지 못했고, 무엇보다 수형인의 직접적인 소감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의 계호(戒護) 없이 수형인과 직접 대화할 수 없다) 그렇듯 나의 교도소 인문학의 경험과 기억은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최근 출판사로부터 추천사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툼한 원고 뭉치를 받았다. <교도소 대학>이라는 제목의 원고다. 교도소 인문학의 추억을 되살리며 읽어나갔다. 도입부에서부터 충격적이다. 그간 간헐적으로 접했던 교도소 인문학 관련 자료들과 사뭇 다르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저는 저대로 뚜렷한 상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다르게 사는 것이었으면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요. 생애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깨닫는 것이었으면 해요, 하지만. (교도소에선)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르기를 강요할 뿐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16쪽)
교도소 내 바드칼리지 입학 면접 당시 피터 베이라는 수형인이 면접관 앞에서 피력한 의견이다. <교도소 대학>은 교수나 연구자의 의견이나 소감이 아닌 수형인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 바로 그 점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교도소 인문학과 확연히 비교되는 점이다.
<교도소 대학>은 1990년대 말, 바드칼리지에서 맥스 케너(Max Kenner)와 동료들이 주도한 바드교도소사업단이 처음 시도하고 가장 널리 보급한 교도소 대학 설립 작업을 두루 돌아본 기록이다. 저자 대니얼 카포위츠는 바드 교도소 대학 사업단(Bard Prison Initiative, BPI)의 정책 및 학술국장이며, 바드칼리지에서 법과 인문학을 강의한다. 2001년부터 바드교도소사업단에서 교수진, 사무국장, 대표로 일했으며, 교도소자유교양학협력단(Consortium for the Liberal Arts in Prison) 공동 창립자다.
공유되지 않은 경험은 경험이 아니다. 사회학자 엄기호에 따르면 “체험은 개별적이고 특이해 설명이 불가능한 반면, 경험은 오직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난다. 경험은 이야기로 만들어 누군가를 깨닫게 할 수 있다”(엄기호,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었어>)라고 한다. 국내에서 10여 년 넘게 교도소 인문학이 진행되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경험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못한 채 참여 강사와 주관 단체의 개인적, 내부적 체험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이제라도 자료가 공유되고, 정보가 흘러서 교도소 인문학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교도소 대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뚜렷하다.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정보가 공유되고, 공론화되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한국형 클레멘트 코스(클레멘트 코스, 1995년 얼 쇼리스가 설립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인문학 강좌)인 성프란시스대학(노숙인 인문학 강좌)이 설립되었던 것처럼, <교도소 대학>의 출간으로 ‘한국형 교도소 대학’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