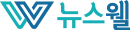중세 유럽, 신학은 학문의 왕이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옳은 절대적인 진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분야가 종교라고 믿었다. 일반 신자뿐이 아니었다. 종교의 사제도 오로지 ‘신’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가르쳤다. ‘신의 뜻’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기쁜 일이든, 끔찍한 재앙이든,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신의 뜻’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오늘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것도 당연한 것이었다. ‘신의 뜻’은 우리 인간이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 밖의 것이었으니까. ‘신의 뜻’은 이해할 수 없어 오히려 확실한 진리였다.
지구 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학문의 왕은 과학이 되었다. 저 먼 화성에 우주선을 정확히 착륙시키고, 아무리 멀어도 손바닥만 한 장치로 서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다. 그래도 명색이 물리학자인 필자도 손에 든 스마트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과학은 이해의 수준을 한참 벗어나 있다. 과학은 현대의 신화가 되었다. 이해할 수 없으니 의심할 수 없고, 어쩌면 그래서 더 확실한 신화.
중세의 신학과 현대의 과학은, 각각 당시의 학문 생태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둘의 차이는 정말 크다. 종교의 사제가 믿으라 할 때, 과학의 사제라 할 수도 있을 법한 과학자는 의심을 말한다. 신이라는 절대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종교가 말할 때,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지금 알고 있다 믿는 것도 어쩌면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과학은 속삭인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말한 과학혁명의 원동력인 ‘무지의 발견’도 바로 이 얘기다. 현대는 이처럼 무지(無知)의 과학과 전지(全知)의 신이 공존하는 시대다. 과학의 가치는 확실성에 있지 않다. 거꾸로다. 의심에 열려있어 토론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 가능성을 늘 남겨두는 것이 과학의 진정한 가치다.
문제는,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는 의심과 회의(懷疑)가 대개는 과학자 사회 내부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과학의 내부가 회의와 의심을 말할 때, 과학 외부 대부분의 사람은 과학을 현대적 확실성의 전형으로 본다. 과학자가 과학은 의심하는 것이라 말할 때,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과학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과학의 확실성을 둘러싼 양쪽의 괴리가 필자는 걱정이다.
과학의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체로서의 과학은 확실성의 정도가 제각각인 여러 이론과 주장들의 모임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운동량 보존 법칙의 확실성은 어마어마하다. 물리학자라면 어느 누구도 그 확실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다는 주장의 확실성도 거의 마찬가지다.
2011년 중성미자라는 입자의 속도가 빛보다 빠르다는 실험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있고, 만약 정말이라면 물리학을 어떻게 다시 구축할 지를 고민하는 물리학자도 있었다. 결국은 엄밀한 재실험을 통해서 중성미자의 속도가 빛보다 빠르다는 주장이 번복되어 많은 물리학자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과학의 내부에서는 백년의 검증을 거친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이론도 이처럼 진지한 의심과 회의, 그리고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학이라는 지적 활동이 진행되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은 확실성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많은 과학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흥미로운 실험결과가 한 학술지에 출판된다. 여러 실험물리학자가 후속 실험을 이어간다. 그 중에는 첫 논문의 결과와 정반대의 논문도 있다. 많은 논문이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다투고, 실험을 더 넓은 맥락으로 확장하는 등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어디선가는 또, 한 연구 그룹이 실험결과를 설명하는 이론 논문을 출판한다. 그런데, 곧이어 출판된 다른 논문은 전혀 다른 이론으로 같은 실험결과를 설명하기도 한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논의의 과정이 이어지다가 과학계 내에서 일종의 암묵적 합의가 서서히 형성된다. 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과학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때도 있다. 자, 이런 일을 겪다 보면, 개개의 과학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다. 방금 출판된 엄청나게 신기하고 흥미로운 결과가 담긴 논문을 읽고, 그 내용을 백퍼센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과학자는 단연코 없다. “흠, 아주 재밌군.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어”, 개연성의 수준에서 받아들인다.
과학자가 과학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생물학의 진화론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에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아주 많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과학자가 확실한 과학도 있다고 말할 때, 어제 발표된 한 과학자의 새로운 실험 논문의 결과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과학과 확실하지 않은 과학의 경계는 확실치 않다. 늘 이동하고 있어 어느 누구도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 그래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과학은 확실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전체로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과학은 신화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