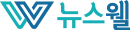몇 주간 바빴다. 머리카락이 너무 자라자 감을 때 쉽게 빠지곤 했다. 단발머리는 간단하게 활동성을 약속하는 것 말고 생명력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신경증은 에고와 견줄 때 혹은 외부의 강력한 권력과 부딪힐 때 강화된다. 상영시간 내내 단발머리였던 ‘세버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반세기가 지나도 여전히 유력한 백인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반기를 든다.
그녀가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파리는 68혁명의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풍광은 기대만큼 자유롭지 않았고 유럽에서 건너온 이들에게 관대하지도 않았다. 신대륙은 사실 이민자들에게 심지어 원주민들에게도 잔인했다. 아메리칸드림과 기회는 대부분 백인 남성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세버그를 연기한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Clouds of Sils Maria) 정도의 자의식과 예민함에는 마침맞지만,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압박감을 담아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금기에 도전할 때의 자세에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한 방어기제를 탑재해야 하는데, 그녀는 성찰적 거리가 아닌 이방인 식 괴리감에 승차한다. 하지만 미·소 냉전의 초기에 거칠게 작동한 국가주의는 실존적 공간을 거의 지워버렸다.
더불어 구대륙의 자존심 드골은 케네디에게 거대한 감자를 날리고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하고 만다. 하지만 패권국 미국은 오히려 금태환의 제약 없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확고히 한다. 바이든정부의 우유부단함으로 미국 재무부는 헝다 사태를 중국 금융시스템의 마비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소진했지만, 연준은 주저함 없이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세버그나 찰리 채플린은 신대륙 할리우드에서 구대륙 유럽으로 역탈주했지만 메카시즘이나 인종차별주의는 여전히 인간 실존을 전체주의의 제단 앞에 던져 놓는다.
인류는 중세 암흑기, 성리학적 교조주의, 20세기에 출현한 여러 전체주의를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지만, 정보혁명 시대는 신경증을 넘어 실재하는 “내 귀에 도청장치” 식의 병증이 빨갱이감별사, 페미감별사 등 여러 감별사들에 의해 증폭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세버그처럼 실재하는 세계의 모순에 자신을 직접 연루시킬 수 없는 자들의 넋두리 같은 실존적 이격 혹은 소비사회의 흉내내기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품게 한다. 감지할 수 없다면, 인식할 수 없다면, 구별할 수 없다면, 진실은 금태환 없는 화폐경제처럼 복제품 혹은 실체 없는 이미지에 둘러싸여 단지 소비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는 인플레이션의 상시적 노출을 가져왔고 이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지만, 양적완화가 코로나 팬데믹에 버프된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모두에게 처음이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영업금지, 휴직 같은 선택적 긴축을 요구할 테고, 우리 사회는 21세기에 들어 만연된 개인화(다른 말로 각자도생)를 극복할 진정한 의미의 개인화(다른 말로 내적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라는 과제에 떠밀리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