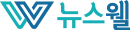영화 <허(Her)>는 <존 말코비치 되기>와 함께 스파이크 존스가 감독한 멋진 영화다. <존 말코비치 되기>에서 사람의 몸과 의식의 문제를 재밌게 다룬 감독은 <허>에서 우리 모두의 관심사, 바로 ‘사랑’에 대해 묻는다. 사랑에 빠질 때, 도대체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존재와는 사랑에 빠질 수 없다면, 보고 듣고 닿는 그 생생한 감각이 사랑의 대상인 걸까? 먼 훗날 현실의 사람과 구별할 수 없고, 심지어는 사람을 뛰어넘는 인공의 존재가 도래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존재와도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영화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주인공 테오드르 역을 열연했다. 어떤 배우가 얼마나 놀라운지 테스트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 그 배우가 출연한 영화 속 캐릭터들을 찾아본다. “아니, 이 영화의 이 배우도 이 사람이었어?”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배우가 난 참 좋다. 호아킨 피닉스는 2019년 개봉한 영화 <조커>의 주인공 역을 연기했고, 2000년 개봉한 <글래디에이터>에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아들 코모두스의 역할을 맡았다.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이 인상적이면서도 모두 서로 달랐다.
테오도르는 의뢰인을 대신해 손글씨체로 출력한 멋진 편지를 보내주는 회사에서 일한다. 의뢰인과 편지 수취인 사이에서 일종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의뢰인과 수취인의 오랜 관계를 고민해 아주 개인적인 느낌까지도 편지에 담아내는 놀라운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테오도르 본인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내와 사이가 멀어져 이혼 직전까지 간 테오도르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티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OS1을 구입한다.
처음 대화를 시작하고 이름을 묻자 OS1은 짧은 시간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해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사만다를 스스로 고른다. 둘의 관계의 시작이 ‘이름 짓기’로 시작한다는 것도 흥미롭다. 현실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새로운 이를 만나 처음 묻는 것이 이름이다.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구별짓기다. 이름으로 대표되는 각 존재의 유일성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교감할 수 없다. 이름이 없다면 그는 내게 와 꽃이 될 수 없다.

영화를 보면서 인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유명한 튜링 테스트가 떠올랐다. 음성이나 문자만으로 소통하면서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도저히 알아낼 수 없다면, 잠정적으로 상대를 인간으로 간주하자는 아이디어가 튜링 테스트의 근간에 놓여있다. 상자를 뜯고 그 안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 지를 보지 말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넘나드는 정보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자는 아이디어다. 영화 속 사만다는 단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로봇공학 분야에 ‘불쾌한 골짜기’라는 것이 있다. 사람과의 유사성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대상에 더 강한 친밀감을 느낀다. 선인장보다 금붕어, 금붕어보다 햄스터, 그리고 햄스터보다 강아지에 우리가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선인장보다 강아지가 인간과 훨씬 더 유사하기 때문이다. ‘불쾌한 골짜기’는 사람과의 유사성이 점점 더 늘어나면,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극도로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깊은 골짜기를 넘어선 로봇이나 인공지능은 아직 없고, 그렇다면 이 골짜기 바로 앞에서 유사성을 늘리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 낫다. <허>의 사만다가 목소리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로봇으로 사만다를 구현하는 것보다 오히려 친밀감의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과 사랑에 빠지는 걸까? 테오도르는 스마트폰에서 출력되는 컴퓨터가 생성한 음성으로 사만다와 소통한다. 스마트폰의 음성 신호가 바로 테오도르와 인공지능 사만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다. 내가 영화를 보면서 반복적으로 떠올린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단어였다. 보고 듣고 닿는 매개체인 인터페이스 없이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인터페이스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참 존재를 가리는 장막일까, 아니면 그 존재 본연의 모습을 가감 없이 명확히 전달하는 투명유리일까? 내가 보는 당신의 모습, 귀에 들리는 당신의 음성, 페이스북에 남긴 문장은 당신의 존재 자체일까, 아니면 당신의 진면목을 흐리는 오류 있는 인터페이스일까? 나와 다른 이 사이에 놓인 인터페이스가 서로를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사랑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믿음일수도 있겠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면 사랑도 가능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것은 둘 사이의 인터페이스일 뿐이다. 그렇다면 사람 사이의 공감과 교감, 그리고 사랑은 인터페이스의 충실성에 대한 증명할 수 없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일 수 있다. 아니, 어쩌면 흐릿한 인터페이스 너머, 상대의 참 모습을 기적처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영화 후반 테오도르는 사만다에게 “당신은 나의 것인지, 아닌지 (You are mine or you are not mine)” 둘 가운데 하나로 답해달라고 절실한 마음으로 묻는다. 사만다는 나는 당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I am yours and I am not yours) 답한다. 논리학에 따르면 나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이 아닐 수는 없다. 모순된 둘이 있다면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는 너무나 자명한 논리다.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니라는 사만다의 말은 논리적인 모순처럼도 들린다.
나는 이 흥미로운 대사에서, 어쩌면 인간의 배중률도 미래의 인공지능의 눈에는 넘어서야 할 한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 가운데 하나를 꼭 우리가 늘 골라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니다. <허>는 SF 영화지만, 동시에 SF 영화가 아니다. 미래 인공지능이 미리 보여주는 두 존재 사이의 사랑에 대한 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