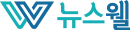몇 해 전 여름, 강릉에서 속초로 가는 해안도로를 하염없이 차를 몰고 가다 해변에 가득한 서핑 보드를 보고 피식 웃고 말았던 적이 있다. 방파제 끝에 서 있는 붉은 등대는 마치 나이트의 사이키 조명과도 같았다.
쾌락법칙의 바깥에 있는 죽음충동 따위의 낭만은 보이지 않았고 요즘 같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영화 <폭풍 속으로>가 떠올랐다.
패트릭 스웨이지와 키아누 리브스가 맞부딪쳤던 그 시절, 우리는 군사정권의 막바지 속에서 레이건이나 카터 같은 전직 대통령 가면을 쓰고 은행을 터는 갱들이 나오는 장면이 부러웠을 뿐이다. 그렇게 군사정권의 권위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 뒤 한세대가 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 번의 민주정부 혹은 진보정권이 찾아왔지만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를 형해화하는 ‘소비와 위험’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소비사회나 위험사회의 측면 모두에서 작동하는 변증법적 범주는 ‘과시와 감시’다.
먼저, 소비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코로나 국면에서는 더욱 손쉽게 바닷가 카페는 창을 걷어내고 탁자를 건물 밖 파라솔 밑으로 보내 버린다. 백사장 위에 몸을 태우는 사람을 쳐다보거나 수평선을 멍하게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여유를 드러내며 과시하는 것이다.
소비의 전당, 백화점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과 브랜드 로고를 전시하며 백화점에 입장하는 것 자체를 과시할 수 있게 한다.
비대면 구매나 마스크 착용 때문에 과시욕의 일부를 희생하기도 하지만 과시욕은 신분제의 잔여물, 혹은 개인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사회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는 위험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울리히 벡은 근대성의 핵심 가치들이 신분제의 잔여물에 침식당해 노동소외, 여성소외 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근본주의가 전체주의적인 양상을 띠며 오히려 근대성을 억압한다고 설명한다.
결국 근대성이 내포한 반근대성으로 인하여 환경위험, 인종청소가 가능한 전쟁, 산업재해 등등의 위험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서구사회는 당연히 근대성 자체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겠지만, 왕도정치와 결합한 관료제가 천년 이상 변증법적 조정을 거치며 발전해 온 동북아시아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민을 줄이고 감시사회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동해안 어느 해수욕장에 높게 세워진 안전 초소나 백화점 건물 곳곳에 설치된 CCTV 아래 감시의 시선을 불편해 하지 않고 허세나 과시의 밑천으로 삼는 것은 패기가 아니다.
폭풍 속으로 사라지는 패트릭 스웨이지나 FBI 배지를 해변에 던져 버리는 키아누 리브스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을 교육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위험을 감시와 맞바꾸며 소비를 과시의 근거로 삼는 허약한 자아는 먼저 매력 없다.
하지만 십 수 년 전에는 주변의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백사장도 짧고 숙소나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해 한적하기만 했던 이 해수욕장을, 호텔이나 음식점 대신 공영주차장을 갖추고 서핑의 성지로 만들어낸 어촌계나 상인회에게 건배를 들고 싶다.
대부분의 관광지는 과잉개발로 본래의 풍광을 잃고 쇠락하게 되는데, 동해안의 어느 해수욕장은 최소한의 개발로 허세에 찌들어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시도하는 젋은이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다.